|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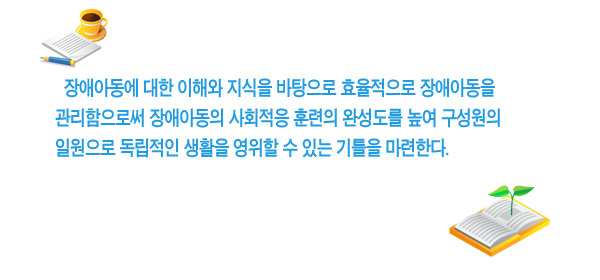 |
| |
| |
| *.
장애부모의 모니터교사 필요성 호소 |
| |
교육청 방문목적은 ‘보조교사 지원요청’이었다.
올해 전국의 보조교사 예산은 1000명 분, 서울에만
535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가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조교사가
없는 경우 부모가 대신하거나 지역 자체예산을 책정하거나
학교 재량으로 해결한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보조교사(모니터교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학과(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관련과 등)의 학생들어게 참여를 권고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며, 교사들의 열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사
중에는 수업시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
|
| |
| *.
교사와 학교의 태도 변화 절실 |
| |
학교의 열의만 있으면 자원 봉사자를 구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학교와 교사의 열의와 태도이다. 보조교사의 도움
없이도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럴 수 있는 교사는 드물 것이다.
보조교사가 필요한데도 그 필요성을 수업에 대한
월권행위로 간주하는 교사가 있고, 또 그러 한
반응을 교사의 특권인 양 인정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 교사들은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이다.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 안팎이라고 해도, 1,2급의
장애 아동이 있으면 교사는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학생들에게 쏟을 수가 없다.
이것은 능력과 열의와는 별개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애아동의 부모 나 비 장애아동의
부모 모두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수학교로부터, 완곡하지만 분명한 입학 거절의
대답을 들었다는 학부모가 있었는가 하면, 현장
학습을 나갈 때 사고가 나도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요구 받은 적이 있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특수학교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아동의 장애가
학교특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내면
교육을 잘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자원봉사자 수요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새 학기 시작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배치가 4월 에나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멀쩡한 보도 블럭을 몇 번 이고 새로 까는 것을
보면서도 예산 부족을 운운하는 당국의 말을 믿어야만
하는 것에 비하면, 어쩌면 그것은 놀랄 일도 아닌지
모르겠다.
이날 부모들은 한없이 작아보였다. 당당한 교육권을
요구하는 데도 그들의 목소리는 땅으로 꺼져 들어가기만
했다. 학교에서 입학 거절의 대답을 들어도 항의를
못했다는 학부모. 그 후 일반 학교에 본인이 아동과
함께 교실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아동의 입학 허가를
받았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실정이 나은 편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태는 점점 심각해진다.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은 얼마나 험한 것일까. 지난
해 7월 기획예산처 1차 예산심의 결과, 정부는
특수교육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고 한다.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 수해율은 43.3%. 그나마 이들
중 많은 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 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입학은 이제 고난의 시작일 뿐일 것일까.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교육원연대의 행보 를 지켜볼 것이며,
교육당국의 태도 또한 주시할 것이다. |
|
| |
|